회원마당
회원동정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열심히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
우리가 추구하는 “바른사회”입니다.
이성낙 자문위원, 의협신문- 의료계, 택시업계를 보며 우리 사회 품격을 본다
- 글쓴이관리자
- 등록일2019-01-21
- 조회수1883
'카풀제'·' 특진비 파기 정책' 등 기존 체계 보완이 '개악'

근래 택시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그 덕분에 며칠 전에는 시내 교통 상황이 놀라울 정도로 여유롭기까지 했지만 말이다. 시내가 텅 빈 듯했다. 이유인즉슨 한 택시 기사가 '카풀제 도입'에 항의하며 안타깝게도 분신자살을 감행했고, 이에 시내 택시들이 대규모 집회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의도에 집결해 국회의사당을 둘러싸고 추모와 항거를 겸한 투쟁에 나섰다. 그만큼 택시업계가 맞닥뜨린 현실이 절박했다는 얘기다.
교통 문제, 또는 택시 문제에 필자는 전문성이 없다. 다만 국내 또는 해외를 오가는 '택시 소비자'로서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생각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국내 교통수단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택시업계의 상황이 국내 의료계가 직면한 현실과 너무나 유사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런던·파리·뉴욕·도쿄 같은 해외 대도시를 여행할 때 택시를 이용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택시비가 만만치 않아 부담스럽기도 하거니와 그걸 감수하더라도 택시 잡기가 대단히 어렵다.
접근성이 매우 나빠 소비자로서 대단히 불편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카풀제의 대명사인 '우버(Uber) 택시'가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국내 사정은 어떤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몇 발자국만 나가면 택시(일반)가 즐비하게 널려 있다. 거기다 택시비 또한 민망할 정도로 저렴하다. 초·중등학생 서너 명이 모여 택시를 이용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듣자니 가까운 거리를 네 명이 함께 택시를 이용하면 각자의 부담액이 시내버스를 타는 것보다 '싸다'고 한다.
요컨대 버스비보다 택시비가 더 저렴하다는 얘기다. 이는 우리 정부가 택시비를 그만큼 비현실적으로 책정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왜곡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해 씁쓸하기까지 하다.
물론 일반 택시를 이용하는 데 따른 아쉬움도 있다. 우리나라 택시 기사는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 '일당'을 채우기 위한 절실함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다. 그런가 하면 승객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운전 중 큰 소리로 통화하는 걸 예사롭게 생각한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와 그에 따른 음향도 거슬릴 때가 많다. 때론 '정치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면서 자신의 주장에 동감해주길 바라는 기사도 있다. 특히 바가지요금을 하소연하는 외국인도 드물지 않다. 일반 택시에서 품격이란 용어는 생소하게 느껴질 뿐이다.
그럼에도 필자는 택시비를 충분히 현실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건 바로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왜 정부가 적극 나서서 '카풀제'를 도입하려 하는지 모르겠다. '카풀제'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흔히 '승차거부', 특히 심야의 '승차거부' 때문에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이미 잘 활용해 정착한 선진적이고 첨단경영 기법이라는 근거도 제시한다.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발상이다. 하지만 서울 거리에 승객 없이 빈 차로 몰려다니는 택시 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그 대안을 찾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 아닐까.
이와 유사한 상황이 의료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택시 요금은 예외적으로 장거리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1만원 내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데 반해 병원비는 정밀 검사라도 한 번 하면 10만원, 심지어 100만원을 훌쩍 넘기기 십상이라는 큰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동일 진료에 따른 발생 비용을 미국이나 프랑스·독일·영국과 비교하면 국내 의료계의 현실은 국내 일반 택시업계의 현실과 대동소이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내 택시비와 의료계의 진료비는 해외의 택시요금이나 병원비에 비해 엄청나게 낮다는 공통점이 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처럼 값싼 서비스는 품질이 나쁠 수밖에 없고,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요구하게 마련이다.
비슷한 상황은 이것 말고도 또 있다. 국내 택시업계에 밀어붙이려는 정부 주도 '카풀제'와 국내 대형 병원에서의 '특진비 파기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근래 하루아침에 국내 의료 전달 시스템이 붕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내 중소 병원에 몰아닥친 어려움은 실로 참담한 수준이다. 게다가 대학 병원은 쏠림 현상으로 인해 몰려드는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는 데 물리적 한계에 다다랐다. 그 결과 진료의 '하향평준화'라는 심각한 현상이 초래되고 말았다.
한 예로 국내 대학 병원에서 심혈관 질환 전문의가 한나절 동안 진료해야 할 환자가 무려 100명에 달한다. 참담한 수치이다. 국가 차원에서 진정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극도로 가난한 나라, 또는 유혈 분쟁 중인 나라의 응급 캠프 수준이다.
1970년대에 독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필자는 한나절에 환자 30명 이상을 진료하지 않겠다고 과감하게 선언한 적이 있다. 30명 이상을 진료하다 보니 문득 무성의하게 환자를 대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치 '독립 선언'이라도 하듯 환자 30명만 진료하겠다고 선언하고 내내 이 원칙을 지켜왔다. 그마저도 귀국 전 근무하던 독일 대학 병원에서 한나절에 12∼15명의 환자를 진료했던 것에 비하면 '파격적'이었지만 말이다.
여기서 필자는 분명한 사실을 하나 지적하고 싶다. 100명이라는 많은 환자가 받는 진료는 물리적으로 '저질 진료'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실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의료계만큼은 오늘날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싼 비지떡'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저질 진료'는 우리 의료계가 앞장서서 막아내야 할 심각한 인권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저질 진료에 따른 피해는 의료 소비자인 국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같이 온 국민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나라 중 이처럼 '의료 전달 체계'가 부재한 국가는 아마 없을 것이다. 하물며 기존 체계를 보완하는게 아니라 개악이라니, 탄식을 금할 수 없다.
어떤 시스템도 구축하기가 어렵지 파괴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법이다. 우리 의료계가 '저질 의학'을 주도하는 현 정책에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다.
2019년 새해를 맞아 환자를 진료함에 품격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희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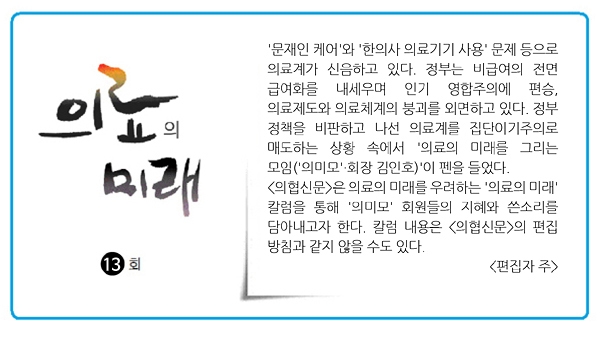 |

이성낙 가천대학교 명예총장
한국의약평론가회 前 회장
근래 택시업계가 큰 혼란에 빠졌다. 그 덕분에 며칠 전에는 시내 교통 상황이 놀라울 정도로 여유롭기까지 했지만 말이다. 시내가 텅 빈 듯했다. 이유인즉슨 한 택시 기사가 '카풀제 도입'에 항의하며 안타깝게도 분신자살을 감행했고, 이에 시내 택시들이 대규모 집회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의도에 집결해 국회의사당을 둘러싸고 추모와 항거를 겸한 투쟁에 나섰다. 그만큼 택시업계가 맞닥뜨린 현실이 절박했다는 얘기다.
교통 문제, 또는 택시 문제에 필자는 전문성이 없다. 다만 국내 또는 해외를 오가는 '택시 소비자'로서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생각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국내 교통수단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택시업계의 상황이 국내 의료계가 직면한 현실과 너무나 유사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런던·파리·뉴욕·도쿄 같은 해외 대도시를 여행할 때 택시를 이용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택시비가 만만치 않아 부담스럽기도 하거니와 그걸 감수하더라도 택시 잡기가 대단히 어렵다.
접근성이 매우 나빠 소비자로서 대단히 불편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카풀제의 대명사인 '우버(Uber) 택시'가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국내 사정은 어떤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몇 발자국만 나가면 택시(일반)가 즐비하게 널려 있다. 거기다 택시비 또한 민망할 정도로 저렴하다. 초·중등학생 서너 명이 모여 택시를 이용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듣자니 가까운 거리를 네 명이 함께 택시를 이용하면 각자의 부담액이 시내버스를 타는 것보다 '싸다'고 한다.
요컨대 버스비보다 택시비가 더 저렴하다는 얘기다. 이는 우리 정부가 택시비를 그만큼 비현실적으로 책정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왜곡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해 씁쓸하기까지 하다.
물론 일반 택시를 이용하는 데 따른 아쉬움도 있다. 우리나라 택시 기사는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 '일당'을 채우기 위한 절실함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다. 그런가 하면 승객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운전 중 큰 소리로 통화하는 걸 예사롭게 생각한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와 그에 따른 음향도 거슬릴 때가 많다. 때론 '정치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면서 자신의 주장에 동감해주길 바라는 기사도 있다. 특히 바가지요금을 하소연하는 외국인도 드물지 않다. 일반 택시에서 품격이란 용어는 생소하게 느껴질 뿐이다.
그럼에도 필자는 택시비를 충분히 현실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건 바로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왜 정부가 적극 나서서 '카풀제'를 도입하려 하는지 모르겠다. '카풀제'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흔히 '승차거부', 특히 심야의 '승차거부' 때문에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이미 잘 활용해 정착한 선진적이고 첨단경영 기법이라는 근거도 제시한다.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발상이다. 하지만 서울 거리에 승객 없이 빈 차로 몰려다니는 택시 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그 대안을 찾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 아닐까.
이와 유사한 상황이 의료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택시 요금은 예외적으로 장거리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1만원 내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데 반해 병원비는 정밀 검사라도 한 번 하면 10만원, 심지어 100만원을 훌쩍 넘기기 십상이라는 큰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동일 진료에 따른 발생 비용을 미국이나 프랑스·독일·영국과 비교하면 국내 의료계의 현실은 국내 일반 택시업계의 현실과 대동소이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내 택시비와 의료계의 진료비는 해외의 택시요금이나 병원비에 비해 엄청나게 낮다는 공통점이 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처럼 값싼 서비스는 품질이 나쁠 수밖에 없고,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요구하게 마련이다.
비슷한 상황은 이것 말고도 또 있다. 국내 택시업계에 밀어붙이려는 정부 주도 '카풀제'와 국내 대형 병원에서의 '특진비 파기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근래 하루아침에 국내 의료 전달 시스템이 붕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내 중소 병원에 몰아닥친 어려움은 실로 참담한 수준이다. 게다가 대학 병원은 쏠림 현상으로 인해 몰려드는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는 데 물리적 한계에 다다랐다. 그 결과 진료의 '하향평준화'라는 심각한 현상이 초래되고 말았다.
한 예로 국내 대학 병원에서 심혈관 질환 전문의가 한나절 동안 진료해야 할 환자가 무려 100명에 달한다. 참담한 수치이다. 국가 차원에서 진정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극도로 가난한 나라, 또는 유혈 분쟁 중인 나라의 응급 캠프 수준이다.
1970년대에 독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필자는 한나절에 환자 30명 이상을 진료하지 않겠다고 과감하게 선언한 적이 있다. 30명 이상을 진료하다 보니 문득 무성의하게 환자를 대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치 '독립 선언'이라도 하듯 환자 30명만 진료하겠다고 선언하고 내내 이 원칙을 지켜왔다. 그마저도 귀국 전 근무하던 독일 대학 병원에서 한나절에 12∼15명의 환자를 진료했던 것에 비하면 '파격적'이었지만 말이다.
여기서 필자는 분명한 사실을 하나 지적하고 싶다. 100명이라는 많은 환자가 받는 진료는 물리적으로 '저질 진료'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실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의료계만큼은 오늘날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싼 비지떡'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저질 진료'는 우리 의료계가 앞장서서 막아내야 할 심각한 인권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저질 진료에 따른 피해는 의료 소비자인 국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같이 온 국민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나라 중 이처럼 '의료 전달 체계'가 부재한 국가는 아마 없을 것이다. 하물며 기존 체계를 보완하는게 아니라 개악이라니, 탄식을 금할 수 없다.
어떤 시스템도 구축하기가 어렵지 파괴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법이다. 우리 의료계가 '저질 의학'을 주도하는 현 정책에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다.
2019년 새해를 맞아 환자를 진료함에 품격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희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이다.





